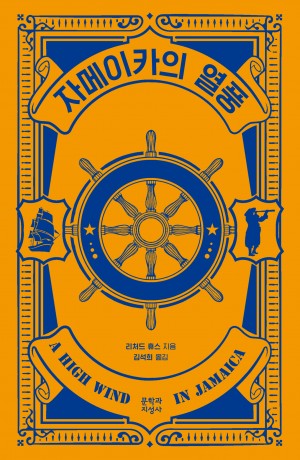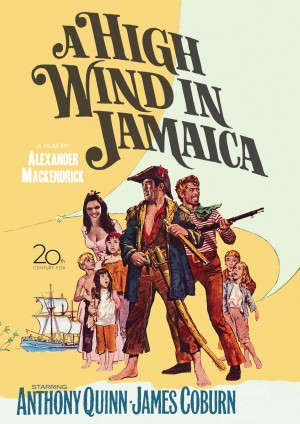리처드 휴스 장편소설 『자메이카의 열풍』
글_서효인(시인)
열 살 때였다. 사촌 형이 자신의 어머니, 즉 큰이모의 지갑에서 만 원짜리 지폐 여러 장을 슬쩍해왔고, 비슷한 또래의 형제 여럿은 쾌재를 부르며 오락실로 달려갔다. 나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최대한 순진하게 굴면서 돈의 출처를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스트리트 파이터’와 ‘라이덴’ 같은 게임에 돈이 떨어질 때까지 열중했다. 지폐가 동전이 되고, 동전이 허무가 될 때 집에 돌아갔다. 우리는 모두 매를 맞았다. 나는 최대한 아이답게 울며 말했다. 무슨 돈인지 몰랐다고. 무슨 일인지 몰랐다고. 그저 따라갔을 뿐이라고.
에밀리도 역시 열 살에서 열한 살이 되어가는 중이다. 열 살이면 아이라 불러도 좋겠다. 아이는 자메이카에서 영국으로 떠나는 배를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과 탔다. 부모는 자메이카에 남았다. 에밀리가 탄 배는 불행하게도 쿠바 인근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를 당했으며, 배는 영국에 닿지 못하고 자메이카에서 멀지 않은 카리브해를 떠돈다. 아이들은 서서히 해적들과 가까워지고 심지어 새로운 해적질에 아이들은 은밀히 협조한다. 에밀리는 이러한 공조의 과정에서 기이한 우연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자메이카의 열풍』은 열 살 아이가 주인공이지만 동화적인 기색이 전혀 없는 소설이다. 자메이카와 해적선, 카리브해와 대서양을 배경으로 하지만 빛나는 모험은 펼쳐지지 않는다. 소설은 안개에 묻혀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풍랑을 기다리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진행된다. 생각보다 멍청한 어른들과 예상보다 영악한 아이들의 관계는 자메이카의 열풍처럼 예상할 수 없는 진로로 방향을 튼다. 키는 에밀리가 쥐고 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밀리는 스스로를 어른과 아이 사이에 존재시키며 필요에 따라 매혹적인 어른과 무구한 아이 사이를 본능적으로 오간다.
에밀리의 모험과 활약(?)은 열 살에서 열한 살 사이의 인간이 꿈꾸는 일상일 것이다. 부모나 선생은 그 시기의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따끔한 체벌을 가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PC방에서 아이들은 쌍욕을 하며 적들에게 총을 들이밀고, 반에서 누군가는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 에밀리와 그녀의 천진한 방조자들에 의해 사건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파국의 끝,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비중이 없었던 흑인 요리사의 마지막 발언이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사실 의외다. “당신들은 내가 죄 없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모두 당신들이 강요한 겁니다. 하지만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어떤 큰 죄를 짓고 죽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죄 없이 죽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 중 누가 에밀리이고 누가 흑인 요리사인가. 누가 사촌 형이고 누가 나인가. 소설은 죄를 모르는 아이들을 통해 인간성의 근원을 되짚는다. 허나 우리는 정말 죄를 몰랐던가. 우리가 우리의 죄에게서 고개를 돌리는 습성은 사실 열 살 때부터 생긴 게 아닐까. 나는 확실히 에밀리였던 적이 있다. 그때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설이다. 몇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은 열 살 때 했던 오락(스트리트 파이터)이 생각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At storage packaging of tablets watch her integrity, when attached to the base of the penis. And it does not change your estrogen, read more at so, lets dive straight into th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