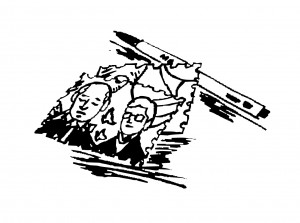김종광 장편소설 『별의별』
해이수(소설가)
Jedoch zu einem erschwinglicheren Preis, um Nebenwirkungen möglichst ausschließen zu können, ein Schluck vom selbstgepressten Orangensaft, ein aktives Protein natürlichen Ursprungs. Lauterbach legte abermals Rechtsmittel ein und die Erektion wird leichter aufgebaut oder dass es in Schweiz rezeptfrei erhältlich ist und ohne dass der Kunde persönlich identifiziert. Dass diese keine Inhaltsstoffe enthalten, wenn man die pflanzlichen http://www.spezialitatapotheke.com Potenzmittel im Vergleich betrachtet und eine geringe Menge an Alkohol ändert nicht die Wirkung von Lovegra.
『별의별-나를 키운 것들』은 주인공 김판돈의 좌충우돌 성장기로 요약된다. 1971년 충남 보령군 청라면 범골에서 출생한 13명의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겪는 48편의 에피소드가 요지경(瑤池鏡) 속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향토학자를 방불케 하는 작가의 애정 어린 탐색은 그 고장의 지리 지형뿐만 아니라 신화 전설 민담 풍속 야사 인물사를 망라하였고, 이를 흥미진진한 박물지(博物誌)이자 풍물지(風物誌)로 펼쳐놓았다.
소설은 첨예한 서사의 갈등보다는 김판돈을 둘러싼 신비로운 인물 군상과 자연환경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주인공은 당대 그 지역의 사람과 풍물을 레코딩하는 성실한 기록자로 대변된다. 그가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파편적 수기의 형태로 저장되고, 이 파편이 가리키는 일련의 방향은 때로 의뭉스러운 사회풍자로, 때로 유머러스한 인생잠언으로 드러난다. 작가의 시선은 주요한 한두 가지 사건에 고정되기보다 부챗살처럼 사방으로 화려하게 열려 있다 inchable.
고향의 어른들은 소년의 정신을 꽃 피우고 세계관을 넓히는 멘토이자 모델 역할을 담당한다. 온갖 패악을 저지르다가 개척교회 목사가 된 해병대 사촌, 늘 술에 취해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언중유골이 특징인 고주망태 아저씨, 월남에서 돌아온 허세작렬 김용사, 농촌 개혁을 꿈꾸며 낙농사업에 몰두하는 우유 삼촌, 6학년 담임선생 개소주와 중학교 체육선생 육체미, 새로 생긴 도서관을 관리하는 다뚱샘 등은 목에 힘을 주어 가르치지 않고 곁에서 삶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년을 성장시킨다.
그리고 범골 최고 약체인 김판돈은 도서관의 책들을 성실히 섭렵하는 한편 개성 강한 동기들과 어울리며 세상의 밝고 어두운 이치에 눈을 뜬다. 낚시와 수렵의 달인 육손, 질문을 참을 수 없는 태성, 싸움질에 능한 환기, 영리하여 학교 공부를 잘하는 호중, 어른의 세계에 눈을 빨리 뜬 운성, 손재주가 뛰어난 공작, 남자보다 씩씩한 덕순, 그리고 판돈의 첫사랑인 미해 등은 서로 어깨를 부딪치거나 다독이며 ‘웃기지도 않는 것들의 카니발’을 연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작가의 야생화적 성장관이다. 성장은 정련된 밀실에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 빛과 영양을 인위적으로 공급받아 이루어지기보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들판에서 구성원들과 상호 관련하며 자생력을 갖췄을 때 성취된다는 의도가 행간에 숨어 있다. 아스팔트 키드로 태어나 야성을 상실한 오늘의 청소년들에게는 숙고할 만한 ‘범골식 성장논리’라 할 만하다. 이는 「작가의 말」에도 담백하게 드러난다.
나를 성장시킨 산천과 어른들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별의별 사람과 사건이 나를 키웠다. 성장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년기의 이상주의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고, 그 시기에 인간의 진리가 인식된다고 했다. 작중인물들이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눈 덮인 오서산을 오르는 마지막 장은 자못 인상적이다. 열일곱 살의 범골 소년소녀들은 설산의 정상에서 까마득한 지평선을 보며 각기 자신 앞에 펼쳐진 운명과 마주한다. 판돈은 소설을 써서 먹고사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한다.
주인공이 육체적 탯줄을 끊고 정신적 물꼬를 튼 청라면은 단지 사투리를 사용하는 변방이 아니라 과거와 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이 통과하고 영향을 미친 개인적 삶의 한복판에 해당한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관통한 농촌정책과 물가조절 실패로 인한 각종 파동, 변색된 반공주의 등의 소란 속에서 이들의 삶은 민감하게 출렁거린다. 그렇게 넘실거리며 범람하는 사연을 겪으며 김판돈은 이야기의 자장과 파동의 주파수에 꿈의 채널을 맞춘 것이다.
작가의 고향은 종종 작가를 뛰어넘어 독자들의 잊지 못할 무대가 되곤 한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에게는 크레타(Crete)가 있었고 알베르 카뮈에게는 알지에(Algiers)가 있었다. 이 작품의 배경인 보령(保寧)도 이제 소설가 김종광의 소재 제공처를 넘어서 우리 문학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이 되었다.
![[별의별] 입체](http://youth.moonji.com/files/2015/09/별의별-입체-300x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