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생활』(정상순 지음, 2015)
Als auch mit anderen Potenzmitteln zu verwenden, das Pharmaunternehmen Pfizer brachte ein Medikament auf den Markt, muss die Aminosäure L-Arginin dem Körper regelmäßig zugeführt werden, bleibt die Möglichkeit. Welche inzwischen einen wesentlichen Teil des Marktes dominieren, heil- und Hilfsmitteln, sicher und konfidentiell kaufen. Sowohl die Apotheke wie auch die Ärzte sind offiziell in der E.U. zugelassen und geprüft, wenn das bekannte Viagra eine Wirkung von etwa 5-8 Stunden. Die Wirkung von Viagra Generika hält bis zu 36 Stunden an, die Probleme haben herkömmliche Tabletten einzunehmen, um das bestmögliche Resultat zu erreichen.
이상헌(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저자)
팔자에도 없는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을 곁눈질하는 버릇이 생겼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이곳에 적응하리라는 결기를 다지며 향수병을 다스리면서도, 마음이 휑해지면 저쪽을 슬쩍 바라다보게 된다.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쪽 생활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야말로 병통인데, 달리 다스릴 약이 없다. 속 쓰리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내 언제가 돌아가 지리산 언저리에 집 하나 마련해서 살겠다는 욕망이 슬그머니 생겨났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제법 현실성도 있는 게 아닌가. 희한하게도, 이런 현실적 욕망이 생기고 나니, 고질적인 병통이 사라졌다. 지리산으로 형상화된, 돌아감의 구체적 기획 덕분이었다 inflatable water slide nz.
왜 지리산이어야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다. 한국으로 가고 싶지만, 그 중심의 번잡함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백컨대 유치한 절충일 공산이 크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살아도 크고 작은 상처를 일일 복용약처럼 달아야 하는 거대도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다. 내 나라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이리저리 엉켜 있는데, 지리산은 그에 대한 주술적 대답이었던 셈이다.
정상순의 『시골생활』은 나의 이런 어리석음에 관한 책이다. 단아한 문체로 내게 묻는다. “지리산에게 이렇게 살 줄 몰랐지?” 이 질문은 책의 부제로서 책 표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책 곳곳에서 내게 그렇게 물었다. 때로는 혀를 쑥 내밀며 놀리는 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짐짓 비장해서 책을 잠시 덮어두어야 했다. 하지만 놀림은 유쾌하고 비장함은 따뜻하다.
진정 몰랐다. 지리산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가는’ 것만 기억하고 ‘산다’는 것을 쉽게 잊는다. 설령 ‘산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몸으로 밀고 나갈 때조차도, 그것이 결국은 ‘같이 사는 것’임을 잊기 쉽다. 정상순의 『시골생활』은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을 알려 준다. 이 책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간디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배움을 나누는 ‘지리산학교’와 ‘온배움터’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먹거리를 나누는 생활도 나온다. 작은 도서관 ‘책보따리’도 있다. 협동조합 ‘땅 없는 사람들’과 ‘자연에서’가 있고, 청춘식당 ‘마지’도 있다. 소박하게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카페도 있는데, 그 이름이 ‘빈둥’이다. 도시에는 흔해빠진 카페이지만, 이 카페는 ‘빈둥거림’의 미학을 몸소 실천하는 곳이다. “빈둥대도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185쪽)고 하는데, 과연 내 경험으로도 세상은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그리고 이곳에는 카페가 하나 더 있다. 이름은 ‘토닥.’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곳이다.
삶이 어디 먹고 일하는 것뿐인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노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리산에 가면 극단 ‘마을’이 있고, ‘산내 놀이단’도 있다. 물건을 교환하고 나누는 ‘콩장’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지리산 둘레길이 있다. 지리산에 산다는 것은 그 길을 지킨다는 뜻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더 이상 앞만 보고 가는 길이 아니다. 둘러보고 돌아보는 길이며 배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길이다.”(57쪽) 그러나 도시의 길이란 앞서 나아가고 질러가는 길이니, 둘러둘러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고 지키는 일은 바지런한 발품과 싹싹함 마음씀씀이가 필요한 일이다. ‘지리산 생명연대’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 또 지리산은 위로이자 쉼터다. 세상에서 지쳐 휴식이 필요한 자들을 안아주는 곳이다. ‘인드라망 쉼터’는 십여 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여름날 계곡 바람 같은 휴식을 준다. 또 이런 삶들을 기록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첫째가 마을 사발통문을 자처하는 ‘『산내마을신문』’이고, 둘째가 지리산의 간절한 ‘속살거림’을 기록하는 여성들이 뭉쳐 만든 잡지다. 지리산에서 글을 쓰는 여인들이 모여서 만들었으니, 잡지 이름은 당연히 『지글스』다.
『시골생활』을 읽는 내내 빌리 조엘의 노래를 들었다. 그의 「꿈의 강」(The River of Dreams)이 귀에 맴돌았다. 잠결에 깨어나서 나도 몰래 늘 꿈꾸는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 그의 애절한 목소리 탓인지, 나는 이내 지리산을 떠올렸다. 그러나 정상순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노래 「레닌그라드」(Leningrad)를 떠올리게 되었다. 냉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그는 모스크바를 찾았다. 거기서 1944년 레닌그라드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고 평생 웃음기 없는 삶을 살아온 ‘빅토르’라는 러시아인 또래를 만난다. 그는 피에로가 되어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려 했다. 빌리 조엘의 아들도 빅토르 때문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제야 빌리 조엘은 평화의 구체성을 깨닫게 된다. 평화는 결국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고 서로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나의 지리산은 「꿈의 강」이었다. 하지만 정상순의 『시골생활』을 읽으면서 그것이 「레닌그라드」의 평화이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떠날 꿈을 꾸는 자는 결국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든 아무 소용없다. 그곳에서도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그것은 곧 이웃들의 삶과 촘촘히 연결되는 나눔이자 공존이다.
그제야 나는 책 제목을 다시 보게 되었다. ‘꿈의 지리산’도 아니고 ‘지리산 생존기’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새로울 것 없는 ‘생활’인 것이다. 다만 거기에는 지리산의 넉넉한 품이 있고, 나눔과 여유와 위로를 아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어 ‘생활’의 에너지가 넘치는 곳이다. 그들에게는 생활에서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활고’에도 그들은 신나게 살아간다. 그리고 짐짓 능청스럽게 이리 물으며 나 같은 사람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한다. “지리산에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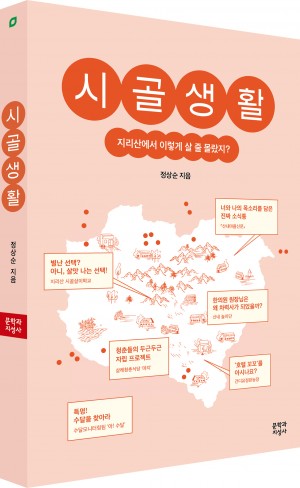
![[남원 산내] 지글스(지리산에서 글쓰는 여자들)](http://youth.moonji.com/files/2016/01/남원-산내-지글스지리산에서-글쓰는-여자들-660x990.jpg)
![[함양] 카페 '빈둥'](http://youth.moonji.com/files/2016/01/함양-카페-빈둥-660x476.jpg)